양산에서 가장 오래된 버스 노선 가운데 하나인 12번 버스는 양산시민의 삶과 역사를 싣고 달려왔다. 일터로 향하는 출근길 아침에는 희망을 주었고, 집으로 향하는 퇴근길 저녁에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었다. 양산시민의 땀과 애환을 싣고 달려온 12번 버스 반세기의 여정을 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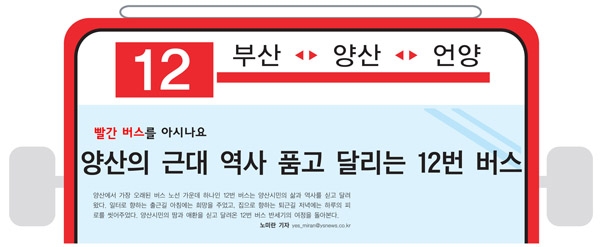
ⓒ
일제강점기 부산~언양 다니던 ‘경남버스’
노선번호 12번은 1995년 돼서야 붙어
‘12번 버스’가 다니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다. 당시 버스 노선은 다양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노선이 여러 지역에 걸쳐 운행했다.
12번 버스 종점 역시 부산 중구 부평동과 충무동으로 옮겼다가 명륜동에 자리 잡았다. 또한 언양행 버스 10회 중 3~4회 정도는 경주까지 운행하기도 했다.
노선번호도 없었다. ‘부산행’, ‘언양행’ 푯말이 전부였다. 노선번호 ‘12번’은 1995년 시외버스에서 농어촌버스로 바뀌면서 붙었다.
이름이 없는 건 아니었다. 주로 ‘경남버스’라 불렸다. 경남지역 버스회사인 경남버스가 1980년도까지 운영했기 때문이다. 색깔 때문에 ‘빨간 버스’로도 불렀다. 양산에서 30년 넘게 살았던 이들 대부분은 12번 버스 대신 ‘경남버스’나 ‘빨간 버스’로 기억하고 있다.
비포장 자갈길 위 덜컹거리는 버스의 추억
팔송~다방 6차선 확장은 불과 10여년 전
하지만 ‘경남버스’나 ‘빨간 버스’는 지금의 12번 버스와는 달랐다. 거북이처럼 느렸고, 멀미가 날 만큼 흔들렸다.
버스는 밤을 닮아 ‘율석(栗石)’이라 불리는 자갈이 깔린 도로 위를 달렸다. 차선 없는 비포장길은 팔송삼거리부터 언양까지 이어졌다. 팔송에서 동면 내송 구간은 경사가 심하고 꼬불꼬불 해 멀미가 심한 승객들은 봉지를 준비해야 할 정도였다. 폭도 차 두 대가 겨우 비켜갈 정도였다.
팔송에서 양산시내로 이어지는 지방도가 지금의 6차선 포장도로로 정비된 것은 불과 10여년 전이다. 비포장 자갈길로 돼 있던 시절인 1960년대 도로의 보수, 유지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취로사업으로 진행됐다.
매년 몇 차례씩 주민들이 직접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와 관청이 제공하는 자갈을 뿌리고 고르는 작업을 해왔다. 그러다 1980년대 초 양산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시행되면서 지금의 구도심 일부구간 도로변의 건물이 철거되고 4차선 도로가 확보됐다.
 |
| ↑↑ 남부시장 정류장에는 앉아서 기다리는 시설과 버스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
| ⓒ |
하지만 팔송으로 이어지는 부산 구간은 그보다 훨씬 뒤에 정비되었다. 도로가 개선되면서 명륜동에서 남부시장까지 1시간 이상 걸리던 것도 40분으로 줄어들었다.
버스가 느렸던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정류소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평과 석계, 현 북부동 신한은행 앞(옛 시외버스터미널) 등은 승차권을 끊는 매표소에 가까웠다.
버스는 손을 흔들어 타려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류소가 아닌 곳에도 정차했다. 그래서 버스가 얼마나 자주 정차하느냐에 따라 소요 시간이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했다. 지금은 정류소 65개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이 도입돼 버스 도착시간도 미리 알 수 있다.
3시간에서 8~10분으로 배차 간격 줄어
남자 버스차장 ‘조수’가 보조 역할도
길게는 3시간, 짧게는 1시간마다 다녔던 버스는 1980년대에 들어와 배차 간격이 줄어들었다.
12번 노선을 푸른교통(옛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과 (주)세원(양산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 맡으면서다. 두 회사는 부산~언양 구간에 모두 15대를 배치했다. 이들 15대는 하루 48차례 오갔다.
지금은 35대가 부산과 언양을 오간다. 운행 횟수도 늘어나 8~10분 간격으로 하루 104번 운행한다. 2010년에는 KTX 울산역(통도사)이 개통하면서 104회 중 27회는 ‘13번’을 달고 울산역까지 간다.
그 시절 12번 버스는 언제나 만원이었다. 그때 중요한 역할이 버스차장이었다. 1992년 양산에서 자취를 감추기 전까지 그녀들은 승객들을 밀어넣고 ‘오라이~’를 외쳤다. 1960~70년대에는 남녀 차장이 쌍을 이뤄 버스 양문을 맡기도 했다. ‘조수’로 불리던 남성 버스차장은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버스에 문제가 생기면 기사를 돕는 역할을 했다.
팔송에서 동면 오갈 땐 승객이 버스 밀기도
17년 전 운임료는 지금보다 700원 비싸
12번 버스의 발자취에서 뺄 수 없는 또 하나가 버스의 변천사다.
해방 전 버스의 연료는 숯이었다. 힘이 달릴 수밖에 없었다. 팔송삼거리와 동면 구간에서는 버스가 힘을 쓰지 못해 승객들이 버스를 밀어야 했다.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승객이 버스를 끌고 다녔다.
 |
| ⓒ |
또한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로 노약자, 장애인이 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운임료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1995년 당시 부산에서 언양까지 운임은 2천100원으로, 현재 1천400원보다 700원이 많았다. 거리에 따른 구간 요금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1998년 단일요금체계로 바뀌면서 기본요금이 500원으로 책정됐고, 14년이 지난 지금은 600원이 오른 1천100원이다.
12번 노선에 자리잡은 관공서는 신도시로
예전엔 천렵꾼, 요즘은 등산객들로 인기
12번 버스 노선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노선을 따라 모여있던 주요 시설은 신도시로 옮겨갔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12번 버스로 웬만한 볼일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요 시설은 12번 노선에 물려 있었다.
옛 군청을 비롯해 양산면사무소,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등기소, 보건소, 농업은행 등이다. 남부시장과 석계장, 신평장, 언양장 등 양산의 크고 작은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다.
12번 버스는 주말이나 휴가철에도 인기였다. 통도사를 비롯한 내원사, 양산천, 홍룡폭포 등 양산의 관광명소를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원사는 여름 휴가철이나 가을 단풍철에 인기였다. 가족이나 지인과 계곡에서 천렵을 즐기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정류소에는 12번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설 정도였다. 지금은 천렵 대신 영축산이나 천성산을 찾는 등산객들로 붐빈다.






 홈
사회
홈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