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기철 시인 |
종종 ‘책을 왜 읽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그때마다 ‘(서재에) 책이 있으니까’라고 말한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책 읽는 사람 행동에는 나름 규칙과 단단한 당위성을 갖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다. 학자나 비평가를 제외한 순수 독자들은 지식을 나눠주려거나 다수 의견을 정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누릴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는다. 강요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일이다.
‘책 좀 읽어’하는 명령은 무리한 요구이자 횡포다. 책 읽기와 사랑하는 문제는 강요에 의해서는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둘 다 ‘빠져야’(falling in)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두고 간서치(看書癡), 책 바보, 책벌레 등으로 부르는 이유다.
앤 퍼디먼이 쓴 ‘서재 결혼시키기’는 제목에서 암시하듯 부부가 소유한 각자 책들을 어느 자리에 놓을지를 두고 충돌하고 화해하는 분투기다. 끝내는 서재에 제 자리 잡은 책을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달콤하다. 열여덟 편 에세이로 구성된 글을 읽다 보면 책 읽는 즐거움, 애서가(愛書家)들이 누리는 행복이 부러울 지경이다.
책을 통해 연애하고 결혼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아이를 낳아 기르던 그녀. 서로 안 지 10년, 함께 산 지 6년,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서재 통합은 부부간 차이를 좁히는 기회도 됐다. 결혼이라는 문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던 사람이 만나 살아가는 매우 어려운 시간 아닌가. 다행히 결이 좋아 큰 탈 없이 살면 백년해로(百年偕老)하고, 아니면 갈라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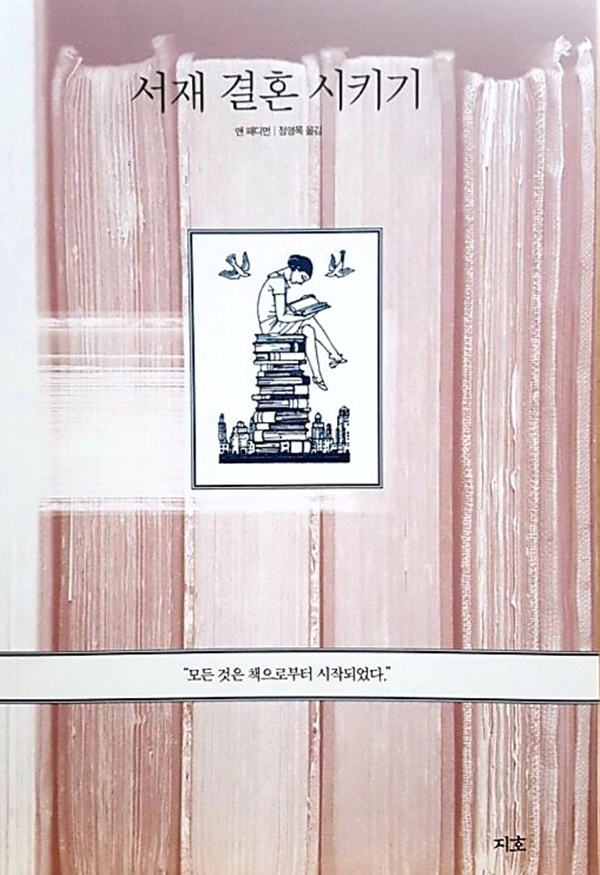 |
| 서재 결혼시키기 책 표지 |
고작 서재 때문에? 결혼도 서재도 두 사람이 가진 정신이 합쳐지는 몹시 어려운 일이다. 저자는 ‘내 식대로 하면 그 사람 책을 찾을 수 없고 남편 식대로 하면 내 책을 찾을 수 없다’고 토로한다. 남편 책과 자기 책이 결혼 생활처럼 부드럽고 아름답게 흐르게 하려면 합의해야 한다.
두 사람이 이렇게 신경전을 편 이유는 분명하다. 서재는 단순히 책만 보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책을 정리, 보관하는 문제는 인테리어 디자인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개인 성향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곳이기에 말이다.
앤 퍼디먼 증언에 따르면 한 책 수집가는 ‘어두워지기 전에는 블라인드를 걷지 말라’고 부인에게 신신당부했단다. 작가 애나 퀸들런도 ‘내 아이들이 집안 장식은 필요한 만큼의 책꽂이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 어른으로 자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재가 한때 장식장이었던 시절이 있다. 벼락부자는 전집류나 금박 입힌 책들을 청계천 일대를 돌며 싹쓸이해 서재를 꾸미기도 했다. 가히 서재 치욕사(恥辱史)라고 할만하다. 오래전 영국 서점에서는 ‘이 책은 소장용이지 독서용이 아닙니다’라고 대놓고 광고하기도 했다. 비록 책이 가구는 아니지만, 집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최상위에 놓여야 한다. 장식품이라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
| 필자 거실 |
서재는 시대를 넘나드는 거소(居巢)이자 거대한 설계실이다. 책 수집은 경제적 이득이 보장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출이 늘어난다. 책을 성처럼 쌓는 노력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서재는 수집한 책들을 모셔오는 공간이다. 책이 한 권 두 권 채워질수록 한 사람이 가진 인격 내‧외부 조화로움이 회복된다.
조병준 작가는 2001년 여름, 서울 혜화동 자택 거실과 바닥까지 쌓인 책 때문에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우리 시대 책벌레 29인의 조용하지만 열렬한 책 이야기- 책, 세상을 말하다’ 중에서) 늘 배고픔에 허덕이는 그에게 책은 새로운 ‘일용할 양식’이었다. 아마 죽는 날까지 그가 당할 허기는 충족되지 않을 게 분명하지만, 날마다 새로운 포만감을 향한 욕망은 줄어들 리 없다. 책벌레 인생은 배고픔이 운명이다. 저주이자 축복이라고 그가 말하는 이유다. 채우려는 욕망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서재는 책이라는 공공재를 잠시 맡아두는 장소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책들은 사용자들 손에 의해 새로 해석되고 널리 전파된다는 점에서 거창하게는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모든 것은 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저자 선언은 그래서 유효한 셈이다. 서평가 오카자키 다케시는 아예 책이 사는 집을 지어 버렸다.(‘장서의 괴로움’ 중에서) 책이 너무 많아 집이 무너진 경우도 있고, 분서갱유(焚書坑儒) 당한 일도 있다.
 |
| 다양한 장서표 |
서재는 현모양처 혹은 악처가 될 수 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리 순탄하지만 않지 않는가. 꼭 서재를 채워야겠다는 이들을 위한 팁이라면 ‘필요 있는가’를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앤 퍼디먼이 말한 ‘서재 결혼시키기’는 과년한 ‘처제 결혼시키기’만큼이나 어렵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일은 성서에서만 경고하는 게 아니다. 인간을 성숙시키는 일에 일조하는 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위험한 존재다. 서재는 이들을 달래고 보관하고 고르고 생명을 불어넣는 장소다. 서재가 때로는 창고와 감옥을 겸하기도 하는 법이니 사용법을 잘 익혀 둬야 한다.
이 책 원제목은 ‘Ex Libris’다. 책 소유자 이름이나 문장을 넣어 책 표지 안쪽에 붙이는 장서표다. 책 소장자를 지칭할 때도 쓴다. 예를 들면 ‘Ex Libris Livius’하면 ‘리비우스가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뜻이다.
아무튼 ‘책 속의 책’인 서재를 사랑하길 바란다. 우리 집에는 서재가 없다고? 천만에 도서관은 뒀다 뭐하게.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