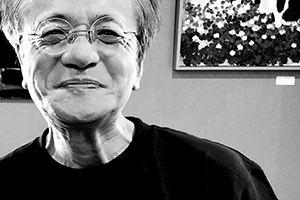
|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는 말은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돈이 척도(尺度)가 되는 일에 반대하는 목소리다. 분명히 그렇다. 세상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많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세상은 불평등에서 기인한 탓이지 개인 문제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이 말을 먼저 꺼내는 이유가 있다. ‘어떤 동네’를 이야기하려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있는 ‘돈’ 생각이 먼저 나서다. 그 동네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다. 비좁고 불편하며 조금은 지저분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어디에나 골고루 비추는 햇살이나 부는 바람이나 내리는 비는 이 동네라고 해서 비켜 가지 않는다. 공평과 평등이 사는 장소, 몸을 의탁하는 곳임을 말해준다.

|
| 어떤 동네 책 표지. |
‘어떤 동네’는 인천 어느 오래된 동네를 20여년간 기록해온 유동훈 선생이 쓰고 찍은 사진 에세이집이다. 멀리서 관찰하며 찍은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셔터를 눌렀다. 저자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한 ‘공부방 삼촌’이었다. 동네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다. 말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눈치껏 ‘아, 거기’라고 짐작한다.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은가? 희로애락(喜怒哀樂)은 고맙고 다행히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는다. 누구나 그런 감정에 뒤섞여 살아간다.
책은 아주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나타나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퍼져 나온다. 우울과 침울 사이를 기대한다면 오산(誤算)이다. 등장인물들 슬픔은 크게 그리지 않았다. 그들 사연도 쓱 지나간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독자들은 그 ‘쓱’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영리하게 찾아내 안도하고 추억한다.
내용은 여섯 마당으로 꾸며져 있다. ‘낡은 담에 기대선 아이들’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목은 껄렁해 보이지만 역설(逆說)을 말하는 ‘불량한 소망’, 특정 공간에서 벌어지는 ‘골목 안에는’, 빠질 수 없는 인물인 ‘할머니 할아버지’, 결국은 공동체로 마무리하려는 생각이 담긴 ‘작은 학교’. 이런 순이다.

|
| 찔레꽃집 앞에서. |
‘어떤 동네’는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방사선형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록처럼 그렇게 따라간다. 결국, 어린이가 어른이 돼가듯 말이다.
‘찍힌’ 사진에 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참 마음이 데워지는 훈훈함이 넘친다. 그늘조차 밝음으로 비치는 묘한 이미지다. 아직 겨울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봄볕 좋은 어느 날’이라고 진단하면서 채 피어나지 못한 ‘찔레꽃집 앞에서 아이들이 활짝 웃음을 터뜨린다’고 말한다. 어깨동무한 네 아이 표정에 이미 봄은 당도했다. 아픈 엄마 아빠를 대신해 동생 손을 꼭 잡고 ‘유월의 지는 햇살 속으로’ 가는 오누이 사진은 울컥하다가도 ‘당당한 걸음’으로 읽혀 안심된다.

|
| 오누이가 간다. |
‘동에서 서로 육백열네 걸음, 남에서 북으로 여든 걸음’ 안에 있는 ‘어떤 동네’. 후미진 골목은 세상을 이어주는 길이자 꿈이다. 이 동네에서 가난을 논하고 가련(可憐)을 말하는 일은 무례다. ‘어떤 동네’든 그런 동네는 없다. 사람 사는 세상은 대동(大同) 세상이고 평등 세상이다.
지은이는 동일 제목으로 오래전 사진전을 연 바 있지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시도한 일은 아니다. 그저 ‘우리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지난해 너무도 아쉽게 일찍 세상을 떠난 건축가 이일훈 선생,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쓴 김중미 작가도 ‘어떤 동네’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책이 나온 지 10년이 훨씬 지났다. 그간 아이들은 ‘자랐다’. 아직 ‘어떤 동네’에 여전히 살고 있는지는 모른다. 다만 그때가 아직도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남아있어 고마울 따름이다.
아, 이 책에서 관심 있게 볼 부분. 표지 제목. 감정을 그대로 전하는 손글씨, 손문상 씨 ’작품‘이다. 서예는 작가주의 예술이지만 캘리그래피는 타인을 대변한다. 이 책을 살린 또 한사람이다.

|
| 이창훈 작, 어떤 동네 시뮬라크르. |
작은 장면도 놓치지 않고 큰 울림으로 되돌려주는 그림 그리는 이창훈 씨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동네’엔 가보지 않았다. 눈길은 끌려가면서도, 가슴이 말렸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삶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입바른 그림을 그리기 부끄러웠다. 섣불리 말할 수 없지만, 거기에 그 집들과 집들이 서로 기대서 자아내는 골목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고.
지금 당신은 어떤 동네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동네에서 살았습니까?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