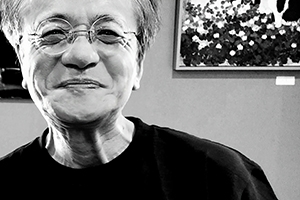
|
|
이기철 시인 |
매무새는 관계에서 신뢰와 긴장감을 동반한다. 지켜온 자신감이자 이해하는 시작점이다.
그가 2021년 여러 날을 쪼개 방문한 프랑스 파리에서 머무르며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장소는 파리 풍물과 건조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을 촬영한 ‘장 외젠 앗제’가 살던 몽파르나스. 이른바 ‘앗제’ 파인더에 잡힌 시대를 현재로 데려왔다. 몽파르나스는 오페라 무대 예술가인 ‘루이자르 망데 다게르’가 ‘탕플 대로’라는 첫 번째 사진 작품을 남긴 도시다.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쓸 때 이곳 가난한 주민들을 모델로 했다. 20세기까지 가난한 동네 중 한 곳이었다는 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시기에 이곳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을 통칭 ‘몽파르노’라 불렀다. 우리에게 익숙한 ‘몽마르트’가 예술가들 아지트였다면 몽파르나스는 이들이 마지막 장소로 택하기 좋은 곳이었다. 걸맞게 묘지(墓地)도 있다. 모파상, 시몬 보부아르, 조르주 상드, 사르트르 등이 잠든 곳이다. 시라크 전 대통령도.

|
| 사진집, ‘파리지엥’ 표지(촬영- 이재봉). |
권일 작가는 도착 즉시 이 묘지에서 만레이, 브라사이 등을 먼저 찾았다. 사진가들이다. ‘사진은 삶의 마지막 포즈를 기억한다’는 평소 철학을 현장에서 재확인한 셈이다. 이후 그는 곧장 파리 시내를 걸어 다니며 그때를 불러냈다. 체류 기간 중 단 한 번도 지하철을 탄 적 없다. 이른 아침 빵 한 조각이면 자정까지 배고픔은 사치였다. 걸어 다니며 ‘지나간 것들’을 빠짐없이 찾아냈다.
사진집 ‘파리지엥’은 ‘파리 셔츠’라는 옷을 입고 재탄생시켰다. 셔츠가 단순히 ‘슈트의 속옷’이라고 단정하는 시선을 바로 잡았다. 파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셔츠’는 ‘제2의 피부’다. 무엇을 입고 걸쳤든 셔츠는 그저 통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셔츠 속에 감춰진 그들 삶을 들추고 읽어냈다. 자유, 평등, 박애는 프랑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사진은 모두 흑백이다. 이전 그가 결정적으로 사용하던 컬러는 딱 한 점뿐이다. 서울 동대문 DDP를 연상시키는 장소에 등장하는 오른쪽 맨 끝 여자(표지 사진). 나머지는 무심한 듯 유심하게 거리를 장식하는 모든 피사체를 남김없이 앵글로 불러들였다. 그가 ‘앗제’를 잊지 못한 이유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묘하게도 사진집에서 화가 에드워드 호프 작품이 중첩되는 느낌은 무엇인가? 부유(浮遊)하는 도시 이미지들.

|
| 개선문 앞 풍경. |
사진가 권일 작품은 ‘살롱 사진’이 아니다. 앞서 그를 모던 보이라 칭한 이유가 있다. 패셔니스트이지만 멋이 아니라 맛이 있는 사진가다. 그에게만 있는 맛. 살롱 작가라고 눈 흘기는 이들은 그만이 가지고 해석하는 방식이 성에 안 차는 불평불만에 불과하다.
김수영 시인은 박인환 詩를 ‘신문 기사만도 못한 시’라고 외면했지만, 김수영도 그를 시샘했다. 와인을 즐긴다 해서 소주파와 떼놓는 불상사를 저지를 일은 아니다. 그가 파리에서 보고 찍고 남긴 스케치는 미라보와 퐁네프 다리에 두고 온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 사진집에는 사진에 대한 설명이 없다. 여행용 가이드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진이 탄생한 파리. 180년이 지난 오늘, 그가 거리에서 본 풍경은 무엇일까?
작가는 시대를 읽는 힘이 있어야 한다. 보란 듯이 혹은 묵묵히 오랜 기간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수집소, 폐기물 등을 재해석해왔다. 파인더에 잡은 피사체마다 생명을 다시 얻었다. 2022년 가을, 그는 사물에 관한 재해석 카드를 다시 내밀었다. ‘하찮은 것, 버려진 것에도 의미는 살아있음’을 강조하는 전시회 ‘CAN’. 안도현 시인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물었듯 버려지고 외면받는 쓰레기에 주목한다. 결국, 오랜 시간 작업해왔던 그가 걸어온 길을 다시 보여준다.
‘캔’은 단순히 ‘깡통’이 아님을 역설한다. ‘리메이크’ 힘이 가진 놀라운 결과를 놀라운 작품으로 보여준다. 그가 하는 모든 작업은 붙박이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다.

|
| 압착시킨 쓰레기 더미를 찍다(CAN 전시회 작품). |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