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기철 시인 |
유순예 시인, ‘속살거려도 다 알아’와 ‘호박꽃 엄마’. 이들보다 먼저 나온 시집, ‘나비, 다녀가시다’는 읽지 못했지만 충분했다. 그 넉넉한 슬픔.
속살거려도 다 알아(2021)
다정한 말인듯해도 ‘들킨 말’이다. 최근까지 치매 어르신을 받들어 모신 경험이 있는 시인이 당황 끝에 들은 말이다. 슬픔을 침해(侵害)한 자들이 변명하듯 남긴 반성문이다. 치매 어르신들 입말을 받아 쓰고 산 생계(生計).
‘요즘 어르신도 잘 잤고/ 똥 어르신도 잘 잤는데요/ 배회 그 어르신은/ 밤새 오락가락하셨어요// 노인 요양 시설 야간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의/ 인수인계 대화를 귀담아들은/ 어르신, 병상에 누워/ 눈을 똥그랗게 뜨고 바라보신다/ 아흔여섯 살인 당신이/ 마흔 살이라고 우기는/ 어르신, 굳어가는 혀로/ 떠듬떠듬 말씀하신다// 소, 속삭, 거, 려, 도, 다, 알아!’ <시, ‘속살거려도 다 알아’ 전부>
이 시는 사실 시인이 하고 싶은 말, 전주(前奏)에 불과하다. 지난(至難)한 삶을 기록하기 위한 변주(變奏). 그렇다. 시편 전체를 통과하는 문장은 가족이다. 특히, 아버지에 관한 약사(略史)는 어머니에 이르러서는 현재진행형인 서사(敍事)를 바뀐다. 부모에게 배운 노동이 시(詩)였다는 전말(顚末)을 밝힌다. ‘아버지 지게와 쟁기, 어머니 호미에서 시론(詩論)을 배웠다’는 시인은 시집 앞에 이제 만날 수 없는 ‘아버지’로 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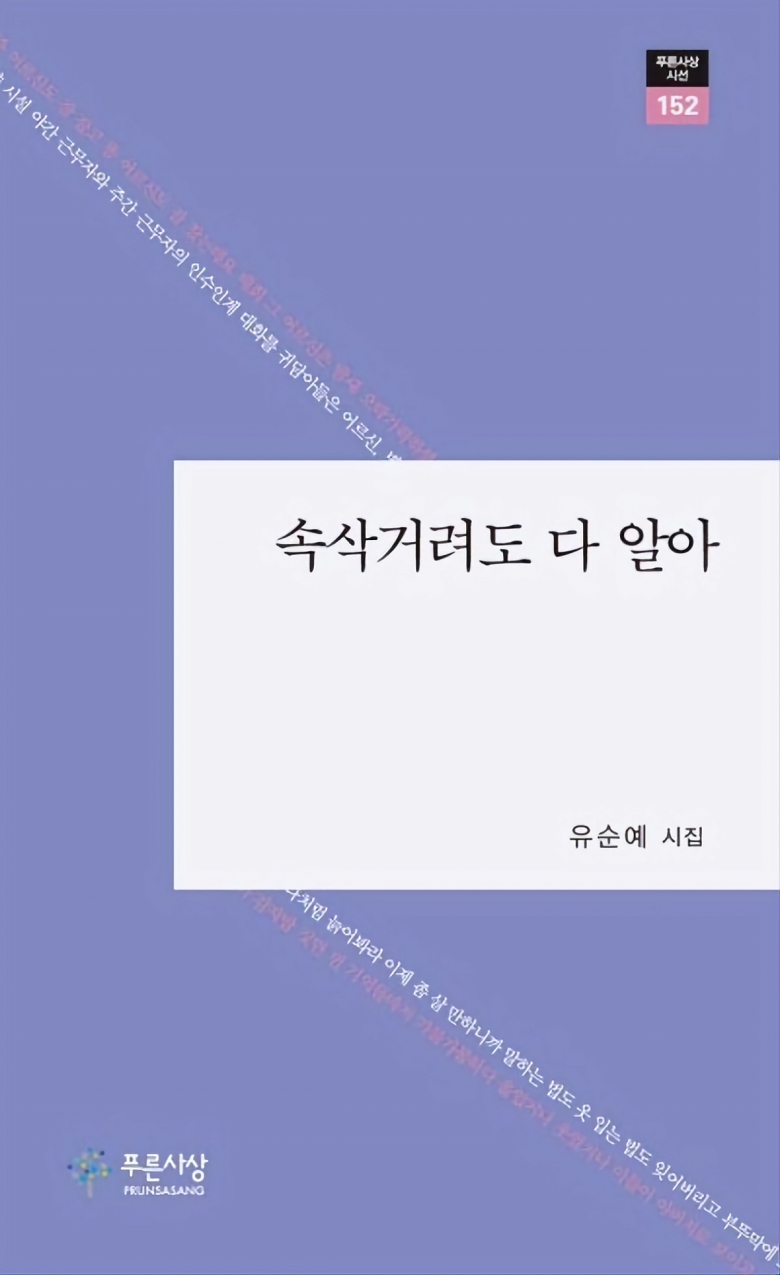 |
| 유순예 시집, ‘속살거려도 다 알아’ 표지. |
‘길종’이라고 써놓은 낡은 삽자루 하나’<시, ‘감기’ 중>는 병수발한 어머니 고단(孤單)으로 이어진다. ‘치매 꽃’ 피기 시작한 병원 생활은 고통스럽다. 지금은 간신히 이겨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시인도 고장(故障)이 잦은 터라 안심은 금물이다. 파란만장(波瀾萬丈)을 보여준다.
유 시인은 ‘탈출’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가두고’, ‘거두는’ 사람이 되어 전진한다. 시편은 직설(直說)이자 역설(逆說)이지만 행간에 스며있는 수많은 설(說)은 외면하기 어렵다. 착한 농부, 2남 5녀 중 둘째인 그녀는 ‘부모님 영농 일기를 베껴 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호박꽃 엄마(2018)
못생긴 어떤 것을 칭할 때 쓰는 말인 ‘호박꽃’은 분명 억울한 말이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못난이는 없다.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지점은 엄마와 닮은 자신을 말한다. 시집 맨 끝에 둔 시다. 식솔(食率)을 먹여 살린 엄마를 빼다 박은 시인이 숨겨 놓은 세상에서 제일 이쁜 꽃이다.
‘새끼들’을 키운 결과로 남은 주름에 관한 자전(自傳)이다. 시인이 남긴 단어와 문장 흔적은 ‘날 것’이다. 직접 겪은 것 외는 일절 말하지 않는다.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은……, 싸구려였어!/ 내 인생은……, 꽃이야 꽃!’ <시, ‘봄, 밤’ 중에서>
계속되는 시에서 발견하는 희망, ‘저들의 반은 아버지 유품이고/ 저들의 반은 어머니 애환들이다/ 녹슨 가마솥/ 낡은 싸리비/ 찌그러진 양은 냄비/ 찌그러진 고무 다라/ 찌그러진……’ <시, ‘아버지 꽃 어머니 꽃’ 중에서>
시인이 부리는 문자는 자유롭고 품새가 넓다. ‘모두 회복 중’이라는 희망에 산다. ‘아줌마로 개명한 뒤 못 질만 늘었다’지만 대못을 박는 일에 이골난 심정이 그저 막막하지는 않다.
 |
| 유순예 시집, ‘호박꽃 엄마’ 표지. |
‘캡사이신’이라는 시를 보자. 제목에서 이미 매운맛이 이만저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시를 짓는 이유가 선명하다. 모두 엄마가 제공한 실마리다. ‘청홍고추, 오이고추, 참외, 옥수수, 강낭콩, 감자, 가지, 애호박, 방울토마토, 된장’. 캡사이신 화학식인 ‘C18H27NO3’은 결국 ‘피땀’으로 읽히는 노동 결실이다.
시인은 개인사만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쪽저쪽 시집을 통해 역사를 잊지 말 것을 주문한다.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 동참한다. 비정규직, 소녀상, 세월호, 촛불, 태평양 전쟁 시 허망하게 돌아온 사망 통지서 등은 시인 심정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유순예식 시 옷’<시, ‘우리 집 바깥양반’ 중에서>을 맘껏 느낀 두 권 시집이었다. 남은 ‘나비, 다녀가시다’는 ‘향후 만남’ 이후로 미뤄둔다.
‘북숭아 나뭇가지 위/ 늙은 호박 한 덩이/ 묵상에 드셨다// 애호박 때부터/ 사는 법을 수확한/ 수행자다// 복숭아 나뭇가지 저만치/ 늙은 어머니/ 혼자 호미질하신다// 어려서부터/ 체험 시를 써서 흙에 새기는/ 육필 시인이다. < 시, ’늙은 호박‘ 전부>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