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전 3.1 독립운동의 열풍이 전국을 뒤덮던 시절 양산의 항일 투쟁도 실로 치열했다. 수 백 명의 군중이 목놓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무수한 인원이 일경의 총칼에 목숨을 잃었다. 일제치하 양산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통해 오늘날 다시금 광복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윤현진ㆍ서병희 선생
 | |
| ↑↑ 윤현진 | |
| ⓒ |
이후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왕성한 활약을 펼치다 1921년 9월 17일 당시 서른의 나이로 중국 상해에서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고, 1965년 선생의 유해를 봉환해 대전국립묘지에 안장했다.
서병희 선생은 1867년 상북면 좌삼리에서 태어났다. 1907년 서울로 올라가 왕산 허위(許爲) 의병장 휘하에 들어가 군사훈련과 의병활동을 함께했고, 그해 겨울 전국 13도 창의군이 결성됐을 때 총대장 이인영 휘하에 허위가 군사장(軍師長)으로 발탁됐다.
서병희 선생이 이끄는 부대는 2년간에 걸쳐 체포될 때까지 끊임없이 전투를 하면서 일본 수비대를 괴롭혔다. 1990년 정부는 서병희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이상환ㆍ김철수 선생
1897년 4월 17일 양산 동면에서 태어난 이상환 선생은 지역청년회 활동으로 청년들에게 민족의식과 반일감정을 불어넣었다. 1919년 3.1만세운동이 전국으로 전개되고 있을 때 선생은 청년회 간부들과 만세시위를 계획,1919년 3월 27일 양산장날에 맞춰 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1일 오후 2시 2차 거사에서 시가행진을 하던 끝에 현장에서 체포돼 1919년 5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6월형이 확정돼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82년 대통령표창,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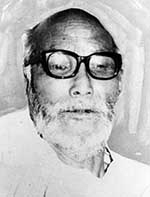 | |
| ↑↑ 김철수 | |
| ⓒ |
태평양전쟁이 한창일 당시 일제가 국내 유명 인사들을 위협 또는 회유해 소위 황민화운동에 앞장 설 것을 강요하자 그는 끝내 이를 거부하고 산중에 은거하다 1945년 광복을 맞이했다. 정부는 1963년 대통령 표창, 1980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윤복이ㆍ김말복 선생
윤복이 선생은 1884년 1월 원동에서 태어나 농업에 종사하던 중 1931년 양산농민조합이 결성되자 조합원으로 활동했다. 1932년 농민조합원이 일경에게 구속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하던 중 일경의 무차별 발포로 복부관통상을 입고 다음날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윤복이 선생의 공훈을 기리며 1986년 대통령 표창,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
| ↑↑ 김말복 | |
| ⓒ |
박문영ㆍ안덕원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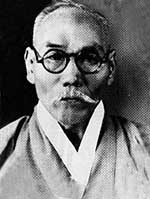 | |
| ↑↑ 박문영 | |
| ⓒ |
안덕원 선생은 산막리에서 태어나 1919년 당시 22세의 청년으로서 이상환 선생이 주도한 양산 독립만세운동에 가담해 군중을 선동하다 일본 헌병에 붙잡혔다. 부산 헌병대로 이송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받았다. 혹독한 옥고를 치르고 출감했으나, 여독으로 앓다 염원하던 조국의 광복은 보지 못한 채 1922년 8월 23일 25세의 아까운 나이로 순국했다. 정부는 1992년 안덕원 선생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이 밖에도 양산향토사연구회에 따르면 김상헌, 이석윤, 서장주, 조병구, 김외득 등 독립유공자 명단에 올라있는 양산지역 인사들은 현재 모두 39명에 이른다.






 홈
기획/특집
홈
기획/특집
